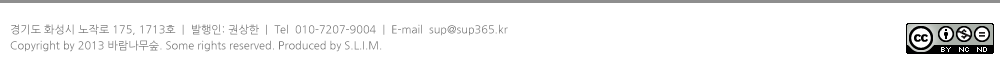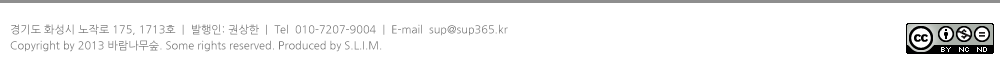제주 올레3길을 걷다보면 담벼락에 그려놓은 재미있는 그림과 뒷집 할망의 글을 발견할 수 있다.
"딸 셋에 부자되고 아들 셋에 집안 거덜나던 그 시절 열 한살 차가운 물에 들어
동상 키우다가 열 아홉 시댁들어 시동생 키웠다가 바다나간 신랑 걱정 내 새끼 때 끼 걱정
큰 바람에 지붕걱정 한 겨울에 무밭걱정 걱정에, 걱정에, 그 걱정이 생활되어 버린 인생...
시간이 흐르고 흘러 시절이 바뀌어 내 아들 장성하여 나를 보러오지만
썩는 무가 아까워 오늘도 해풍에 하영 말려 네게 보낸다."
- 뒷집 할망 -
이 글에서 질곡의 삶을 보내고 할망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식 걱정인 이 땅의 평범한 부모를 엿본다.
물론 제주에서, 혹은 강원도 두메 산골에서, 혹은 도심의 변두리나 어느 달동네에서 각각의 겪은 삶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 결의 깊이와 너비와 질감은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 글을 읽다보니 안해와 결혼 후 그런 삶의 결을 지닌 어른 두 분과 20여년을 동거해왔던 삶을 반추하게 된다.
젊은 나이 과부가 되어 딸 하나 고생시키지 않으려 온갖 풍파를 겪으며 살아온 장모와
그런 장모를 도와 식당의 온갖 궂은 일을 하며 결혼도 않고 40년을 함께 살아온 처이모...
추계리 시골로 이사온 후 처음 맞는 겨울 찬 바람을 맞으며 거실 벽난로의 불쏘시개를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두 어른에게
"남들이 보면 욕 해요. 그 집은 젊은 사람들은 뭐하고 여든이 다 된 할머니들이 나무하러 오냐구."라며 성화를 해대도
"운동 겸 산책하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마른 나뭇가지 몇 개 짊어지고 오는게 뭐가 힘드냐"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결국 라면 박스로 두 통은 될법한 마른 나뭇가지를 담아 오신다.
그 마른 나뭇가지를 불쏘시개 삼아 새벽이고, 어둡게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언제나 늘 앞서서 불을 피우신다.
당신이 왜 그리 하는지 알면서도 '고맙다'는 말보다는 '너무 힘들게 그리 마세요'라는 부정적인 언어가 앞서는 나는
여전히 10대 반항기 가득한 청소년이다. 그렇다.
이제 몇 일 후면 쉰 나이가 될 나는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 앞에서는 여전히 10대일뿐이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요즘, 살아오며 생긴 깊은 결만큼이나 사랑 가득한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한다.
그래서인지 식구로 살았던 날보다 이제는 가족으로 살아온 날이 많은 시골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을 또한 그리워한다.
연탄가스로 중독된 막내 아들을 들쳐업고 새벽 찬 공기를 가르며 응급실로 뛰어갔던, 지금보다는 많이 단단했을 아버지의 서늘한 등과
촛불 하나 켜 놓고 내일의 일용할 양식을 벌기 위해 밤새 비닐봉지에 가래떡을 썰어 담아내던 어머니의 거친 손등과,
그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막으며 세 아들을 키웠지만 정작 당신들은 아직도 이 추운 겨울날
기름을 아끼느라 전기장판의 온기에 겨우 찬 몸을 뉘인 늙으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참 그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도 앞바다에 잠들어 있을 세월호 실종자, 그들의 부모와
최저생계비로, 쥐꼬리만한 노령연금으로 겨우 연명하고, 폐지를 팔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땅의 가난한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이렇게 추운 날이면 몹시도 그립다. 그리고 마음 시리다.
그들을 위해 따뜻한 봄이 빨리 왔으면 하는 되지도 않는 바람을 12월 한 겨울에 하늘로 올려보낸다.
[글과 사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