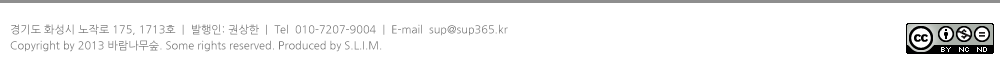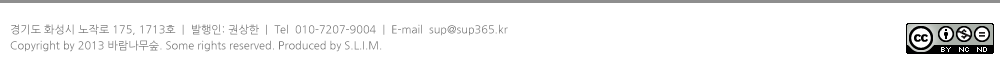밥심으로 살 던 때가 있었다.
아니 요즘도 밥심으로 살아가야 마땅한데, 패스트푸드나 게임에 의지해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밥이 아니라도 먹을게 넘쳐 나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아이들,
하지만 물질의 결핍을 모르기에 더욱 정신의 결핍 속에서 마음을 잃어가는 아이들의 빈곤이 읽힌다.
그래서 그런 풍요 속의 빈곤이 주는 아이러니가 더욱 애닯고 가슴 아프다.
거기에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의 속도에 맞춰 일상도 더욱 분주하기만 하다.
그래서 길로 내몰린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채 무작정 뛰어야 한다.
때로는 팔꿈치로 옆 친구를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칙도 써야 한다.
어떤 아이는 뛰지 않고 자전거로 바꿔타고, 또 어떤 아이는 엄마가 제공한 기사딸린 자동차로 여유있게 달려간다.
그렇게 달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보면 방향은 무시하고 속도만 높여 달려온 삶 자체가
아무 의미도 없다고 목청껏 소리지르며 쓰나미처럼 밀려오면, 엄습해오면
아이는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어 쓰러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만다.
밥심이 없어 쉬이 넘어지고, 또 일어서지 못한다.
교실이란 공간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왕성하게 분비되는 호르몬 만큼이나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는 14세 아이들과 함께
밥심을 살리기 위해 청량리에서 20년 넘게 한결같이 밥을 퍼온 다일공동체를 찾았다.
영하로 내려간 날씨에 함박눈까지 휘날렸던 11월 말의 갑작스런 추위에도 아랑곳않고 아이들은 날랐다. 그리고 날랐다.
밥을 나르고 몸을 날리며 밥퍼 봉사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배우고 가르침의 새로운 개념을 정의한다.
이곳이 바로 진리가 창조되는 교실이었고, 이곳에서 밥을 먹는 노숙자가, 밥을 담는 봉사자가 바로 교사였다.
한 방울의 물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께닫고, 한 톨의 곡식에 담긴 많은 사람들의 땅방울을 느끼며
온 몸으로 배우고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배움과 가르침의 일치가 이루어진다.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밥을 통한 나눔으로 화해와 일치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밥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밥심은 속도에 연연하지 않고 가야할 바른 방향으로 매일 조금씩 천천히 가을을 추수하기 위해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다.
[글과 사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