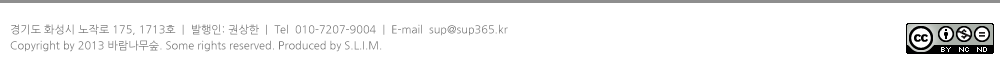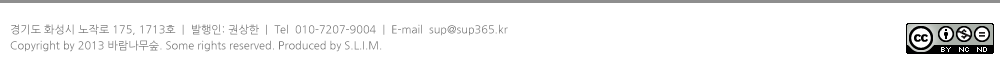살펴보면 나는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고
나의 아들의 아버지이고
나의 형의 동생이고
나의 동생의 형이고
나의 아내의 남편아고
나의 누이의 오빠고
나의 아저씨의 조카고
나의 조카의 아저씨이고
나의 선생의 제자고
나의 나라의 납세자고
나의 마을의 예비군이고
나의 친구의 친구고
나의 적의 적이고
나의 의사의 환자고
나의 단골 술집의 손님이고
나의 개의 주인이고
나의 집의 가장이다
그렇다면 나는 아들이고
아버지이고
동생이고
형이고
남편이고
오빠고
조카고
아저씨고
제자고
선생이고
납세자고
예비군이고
친구고
적이고
환자고
손님이고
주인이고
가장이지
오직 하나뿐인 나는 아니다
과연 아무도 모르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누구인가
- 김광규, <나>
지X총량의 법칙이란게 있단다.
김두식 교수가 "불편해도 괜찮아"란 '영화보다 재미있는 인권이야기'를 다룬 책에서 언급했는데,
나름 설득력이 있다.
그 법칙이란, 사람은 태어나서 생애를 거쳐 지X을 하는 양이 일정해서,
어린시절에 지X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는 지X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어린시절에 얌전하고 모범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 '지X총량의 법칙'에 의해
어른이 되어서 미처 하지 못한 지X들을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돌아보게 하고
대개 10~20대에 '내가 누구인가'를 물으며 철학적 고민을 하게 하는 서양인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기엔 공부에 치여 별 생각없이 살다가
40~50대나 되어서야 '나'를 고민하며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기 시작한다.
두 차례 정도 방문했던 북유럽 국가를 보면 청소년기에 철학적 사유를 할 여유가 충분히 주어진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바로 진학하지 않고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삶의 경험을 쌓거나 여행을 하다
정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준비가 되었을 때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가.
대학에 들어갈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점수에 맞춰 그냥 떠밀리듯 대학에 들어간 후 본인의 적성이나 비전과 맞지 않아
대학을 졸업한 후 뒤늦게 찾은 비전을 위해 다시 공부하거나,
아니면 전공한 분야와는 전혀 다른 직업을 선택해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나마 졸업 후 몇 년 내에 자신에게 옷을 찾았으면 다행이지만
불혹의 나이가 될 때까지도 자기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다가 소위 '지X'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나는, 진로교육에 있어 가장 우선 해야할 것이 '우리들'이 아닌 '나들'을 찾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기에 김광규의 시를 가장 먼저 읽게 한 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게 한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는 동안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의 사이를 발견하게 되는 까닭이다.
시인은 오로지 시만을 생각하고
정치가는 오로지 정치만을 생각하고
경제인은 오로지 경제만을 생각하고
근로자는 오로지 노동만을 생각하고
법관은 오로지 법만을 생각하고
군인은 오로지 전쟁만을 생각하고
기사는 오로지 공장만을 생각하고
농민은 오로지 농사만을 생각하고
관리는 오로지 관청만을 생각하고
학자는 오로지 학문만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이 낙원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시와 정치의 사이
정치와 경제의 사이
경제와 노동의 사이
노동과 법의 사이
전쟁과 공장의 사이
공장과 농사의 사이
농사와 관청의 사이
관청과 학문의 사이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만
휴지와
권력과
돈과
착취와
형무소와
폐허와
공해와
농약과
억압과
통계가
남을 뿐이다
-김광규 시집 <우리를 적시는 마지막 꿈>에서 '생각의 사이'
[글과 사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