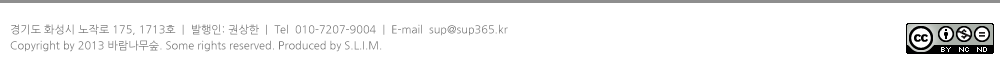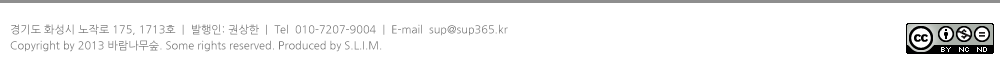아침 신문을 읽다가
경남 밀양 고답마을 노인들이 경찰 숙소로 사용할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을 입구에서 모닥불을 피우며 밤을 지새우는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부끄러웠다.
얼마 전 송년회를 마치고 자정무렵에 귀가 하던 중 판교 들머리를 지나다
그 시간까지 교회 앞에 훤히 밝혀진 장식등을 보며 참 부끄러웠다.
교회마다 밝힌 저 전등만 내려도(off) 힘없는 이들이 사는 마을을
무차별적으로 에워싸며 설치해야 할 송전탑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교회 이름은 저마다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가득하며', '섬기는' 교회인데
세상은 여전히 힘없는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지도자 뿐이고 사랑과 평화가 온데 간데 없다.
'우리들'이라 말하지만 '나'뿐이며, '거룩한 빛'과 '은혜'를 강조하지만
이 세상에선 교회가 드리운 그림자에 어제 내린 눈이 여전히 녹지 않은 빙판길이라 걷기조차 불편하다.
이제는 밤새도록 켜둔 십자가의 전원을 내리고 그 십자가를 들고
이 땅에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
그분들이 아프면 그가 아프기 때문에 은혜입은 그리스도인이 먼저
밀양으로, 용산으로, 시청으로 걸어가 함께 울고 함께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그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전기로 밝힌 붉은 십자가가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붉은 십자가 향내를 맡으며 멀어져 간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
[글, 바람 ; 사진, 장영식 사진가가 제공한 것을 한겨레신문에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