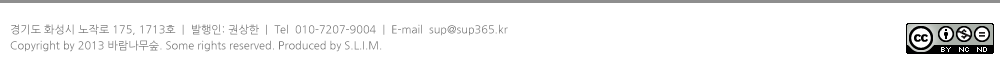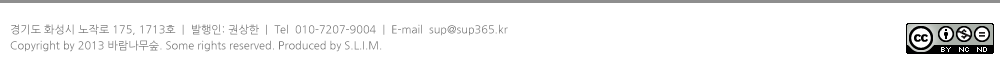지난 겨울 제주도 어느 청무우밭에서
1930년대 이태준, 정지용, 이효석 등과 함께 구인회를 조직한 김기림이란 시인이 있다.
일본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리처즈의 이론을 도입해 모더니즘의 시 이론을 소개했고,
그 이론에 따라 모더니즘 계열의 시를 쓴 시인었다.
그의 대표적인 시 중에 '바다와 나비'란 시가 있다.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 나미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무 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 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1946) -
'바다'와 '나비'라는 대조적 이미지를 결합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을 노래한 시로써
1930년대 모더니즘 계열을 대표하는 중요한 작품이다.
이 시에서 선명한 색채적 대조를 이룬 '바다'와 '나비'가 주는 긴장감은 단지 감각적 이미지를 넘어서
함축적인 의미를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다.
순진한 하얀 '나비'는 차가운 파아란 '바다'의 냉혹을 모른다.
출렁이는 파도를 보면서도 푸른 바다를 '청무우밭'으로 여길만큼 순진하고 또 무지하다.
결국 갸날프기 그지없는 순진한 '나비'의 꿈은 시리도록 날카로운 초승달에 베이고 만다.
현실은 참 냉혹하다. 특히나 나아갈 길을 살피고 찾는 어린 나들의 앞길은 시련의 연속이다.
청무우밭과 같은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파도가 넘실대는 시퍼런 바다로 바뀐지 오래다.
그런데도 이 땅의 교육은 늘 낭만적인 청무우밭 청사진만 제시한다.
그래서 바라보는 세상은 집과 학원과 그 사이을 오가면서 보는 스마트폰 안의 5인치 세상이 전부다.
그리 착하게 살다보면 낭만적인 내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낭만을 꿈꾸기도 전에, 청무우밭과 같은 바다에 다다르기도 전에
학원 버스를 벗어날 길이 없어 제 스스로 노란 빛깔로 진화한 나비는, 아니 나비처럼
우리의 아이들은 잔혹한 노래를 부른다.
학원 가기 싫은 날 물고기처럼 날고싶어 마지막 남은 엄마의 심장까지 가장 고통스럽게 먹어버린다.
하얀 감수성을 지닌 모던한 '나비'는 75년을 관통해 오는 동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삶아먹고 구워먹는 잔혹한 감수성만 가진 아이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아이보다 더 잔혹한 어른들은, 아이를 그렇게 만든 세상은
외려 아이를 비난하고 그의 노래를 난도질해 버린 뒤
아이가 더 이상의 생각도 못하고 꿈도 꿀 수 없도록, 삶아 먹는다.
동시는 착하고 귀여운 시란 뜻이 아니다.
동시란, 글자 그대로 어린 아이가 쓴 시다.
당대 어린이의 시적 감수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곧 동시대 어른의 삶을 그대로 비추어 낸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어른들은 '나비'처럼 낭만적 이상을 품을 겨를도 주지 않고 자신들이 겪은 '공포와 좌절'만
다음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전이시키고 투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글과 사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