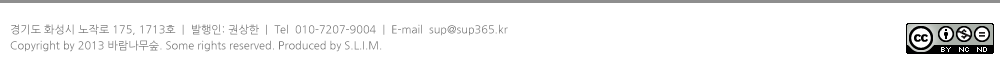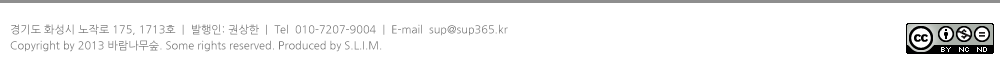아직 읽지 않은 책이지만 누군가 옮겨 놓은 책소개를 읽으며 마음이 아득해진다. '어쩌면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재력부터 파악하고 곧 자살부터 하고 다음 생에서 다른 부모를 선택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자조섞인 이야기를 예사로 넘길 수 없는 것은 세상이 여전히 이렇도록 만든 책임의 일부가, 이제는 어른으로 살아야할 내게도 있기 때문이다.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안에서의 어른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내가 말로만 세상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로만 바꾼 세상은 아침이 되면 사이버세상보다 더 힘없이 허물어져 있고, 그래서 나는 더 무기력해진다.
이 시대 청춘의 모습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준다는 <청춘의 민낯>이란 책이다.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읽으며, 다음세대를 위한다면서, 외려 다음세대가 사용할 자원과 에너지를 탕진하는 지금세대의 세태를 바라보며, "내 몸, 내 시간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슬픔"이란 이 책의 부제가 더 아프게 다가온다. 아울러 에어백은 고사하고 안전벨트 정도의 보호장치도 만들어 주지 않고 우리의 아이들을 속도무제한의 아우토반에 몰아낸 것 같은 자괴감이 밀려온다.
결국 군중을 만족시키기 위해 침묵한 빌라도나 내가 도찐개찐이 아닌가 싶다. 예수를 시기해 음모한 대사제보다, 폭동을 선동한 바라빠보다, 뭣도 모르고 외치는 군중들보다 어쩌면 죄 없다 알면서도 말 없이 지켜만 본 그가 곧 오늘 내 모습은 아니가 자문해본다. 그래서 <청춘의 민낯>에 내 낯이 뜨거워진다.
[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