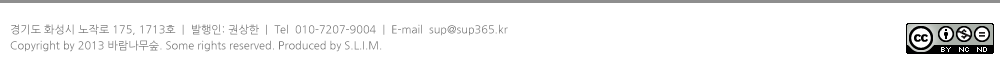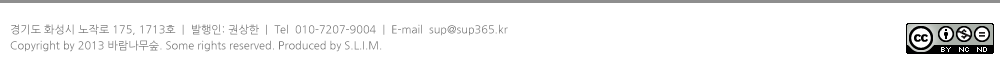요즘 음식솜씨가 잼병인 내가 가장 초간단 요리들인 브런치를 배우고 있다.
그 중 한가지, 프랜치 토스트와 닭안심, 캐슈넛 볶음을 실습했다.
다들 성질이 다른 재료들이 서로 잘난체 하지 않고 어우러져 하나의 맛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재미있다.
불로 확 꼬실려져야 하고, 소금이나 간장 등의 간을 쳐야 한다.
어떤 건 설탕으로 살짝 맛을 달달하니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초간단 요리 하나로 배우는 것이 많다.
각 색을 가진 채소들이 어떤 것(부추)은 불을 두려워하고, 어떤 것(양파)은 불을 즐기며 그 가진 맛을 낸다.
여기에 전혀 성질이 다른 고기(닭)가 들어와 전체적인 중심을 잡아준다.
채소를 먹으면 고기가 땡기고, 고기를 먹다보면 채소가 그리워진다.
그래서 연인이나 배우자를 택할 때도 나와는 좀 다른 면을 가진 사람에 호기심과 매력을 느끼는지 모르겠다.
한데, 이 재료들은 죽어있는 것이라 서로 다투지 않고 평화로이 함께 한가지의 요리가 되는 것일까?
살아있는 것이라면 닭이 식물을 쪼아 먹거나, 불이나 소금을 피하겠지?
나의 주장을 펼치려는 자존심의 죽음이 결국 평화의 토대가 되는 건 아닌지......
죽은 닭 때문에 더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거기에 어우러지는 식물들이 더없이 향기롭게 느껴지는 건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지는 않기 때문일 것이다.
어디에서든 평화를 지키는 자로 살고 싶다.
바램은 그렇지만, 쉽지 않다.
그래도 바라다보면 어느 때엔가는 가능해질 것이다.
나도 이들(요리의 다양한 재료들)처럼 꼭 필요하지만, 나만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사진과 글, 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