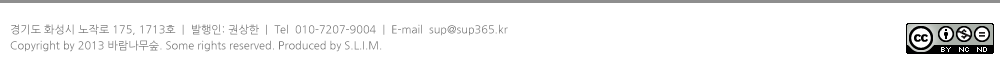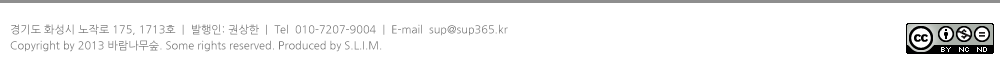어린이날 굳이 챙겨줘야 할 어린이가 없는 까닭도 있지만 이런 날 집 나가면 개고생만 할거라는 생각에
지척에 에버랜드를 두고도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그런데 저녁 뉴스에 에버랜드가 너무나 한산했다는 보도를 들으면서 이런 날 한번 가 볼걸 하는
생각을 뒤늦게 했다. 사는게 다 그런가보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늘 갈등하다 선택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그래서 늘 순간에 충실하고 후회없이 사는 것이 제일로 좋겠지만은,
그렇게 어린이날을 보내고 난 다음 날 이제는 어린이가 아닌 작은 아들의 자원봉사를 핑계삼아
용인농촌테마파크에 소풍을 갔다.
앵벌이처럼 아이는 집게와 자루를 들고 다니며 쓰레기를 줍고 다니는데
그의 아빠와 엄마는 원두막 누워 농촌테마파크의 온갖 화초와 바람과 여유를 즐긴다.
이것을 유유자적한다고 하나. 지척에 물레방아를 따라 빙글 회전하며 돌아나온 작은 연못의 물도 유유히 흘러가는데,
갑자기 죄책감이 드는 것은 왜일까. 화장실에 다녀오다 뙤약볕 아래서 작은 노동을 하고 있는 아들때문은 아닌 듯 한데,
문득 지금 원두막 그늘 안에서 누리는 이 호사가 농촌의 그들과 같은 것은 아닐것이라는 자괴감때문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났다.
지금 나의 그늘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하루종일 따가운 햇살과 딱딱한 흙과 작달만한 모종이나 씨앗과 씨름한 후
등짝이나 이마에 흐르는 땀을 식히는 농부가 누리는 원두막의 그늘과는 다르다.
오늘의 농촌이 분명 이 그림과 같이 낭만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고 보니 지금 여기의 바람과 물과 봄꽃 앞에서 내 몸과 마음은 더욱 겸손해진다.
그리고, 다만 소박한 기도를 드린다.
지금 여기에 부는 바람과 물과 봄꽃의 아름다움이 늘 허리를 굽히는 겸손으로 오늘도 생명을 돌보는 위대한 일에 쉼없는
이 시대의 농민의 삶에도 가득하길,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총으로 올해도 풍년이기를 소망한다.
[글과 사진, 바람]